‘3중고’ 빠진 자영업, 직장인 가구보다 월소득 90만원 적어
 |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가구 거리’의 한 매장에 걸려 있는 점포 정리 펼침막. 한겨레 자료 사진 |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➍ ‘자영업 위기’ 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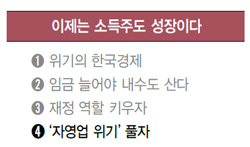 |
※3중고 : 유입과잉·내수부진·대기업 침범
2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시작한 김영철(가명·42)씨는 매일 밤 퇴근하고 나서 소주 2병을 마셔야 잠이 든다. 가게를 내기 전까지 그는 연봉 4000만원가량을 받는 직장인이었다. 그때보다 근무시간은 훨씬 늘어 주 7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지만 연 수입은 18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김씨는 “아이가 다섯살인데 놀이공원 한번 데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직원과 맞교대로 일하는 김씨가 하루 종일 14시간씩 일을 해도 벌이가 변변치 못한 것은 골목마다 편의점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2000년에 전국적으로 2800개 수준이던 편의점은 현재 2만5000개에 이른다. 골목 구석구석에 있던 구멍가게들에도 하나둘씩 편의점 간판이 달렸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의 소매 자영업체당 인구수는 99.3명(2012년 기준)으로 100명에도 못미치는 과밀상태다.
본사에 매출이익의 35%를 내야 하는 수익배분 구조도 김씨를 힘들게 했다. 나머지 매출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쓰고 나면 김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구조에서 김씨가 수익을 내려면 날마다 매출 150만원은 올려야 했지만 쉽지 않은 문턱이었다. 심지어 폐점하더라도 6개월가량은 동일하게 본사에 내던 만큼 돈을 내야 하는 계약 구조였다. 그는 “시골 논두렁에다 만들어놔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뒤늦게 알게 됐다.
편의점 손님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사정이 훨씬 더 안 좋아졌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주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130만원에도 못미치는 100만원가량만 김씨의 몫으로 남는 때도 많았다. 부천의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김씨네 세 식구는 집을 팔아 다세대주택의 월세방으로 옮겼다. 편의점의 불공정 계약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일부 계약조건 개선에 나섰지만,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김씨는 두달 전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한 채 개인 편의점으로 돌아섰다. 얼마 전 그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옷을 파는 것처럼 ‘편의점 창업’을 파는 방송(가맹점주 모집)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과당경쟁 상황에 만성화된 내수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빵집 등)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에서 밀려난 이들이 가장 손쉽게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다. 두 업종이 전체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1%와 32.0%(200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18.3%포인트, 15.6%포인트 높다.
향후 몇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면 서비스업종의 자영업 가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 규모가 13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퇴직 후 재취업 곤란, 연금소득 미흡 등의 요인으로 50살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신규 유입을 억제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수부진도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00년 이후 민간 내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밑도는 등 내수부진은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특징이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전국 1만490곳 조사)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10년에 소상공인들 절반 이상의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 상태인 경우도 적잖았다.
이런 현실 탓에 자영업 가구의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견줘서도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 311만1000원(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으로 임금근로 가구(401만5000원)에 비해 90만4000원이 적었다. 2010년에는 양쪽의 격차가 72만4000원이었지만 2011년(73만2000원)과 2012년(79만7000원)을 거치면서 차이가 커졌다. 특히 소득 하위 분위로 갈수록 자영업과 임금근로 가구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런 탓에 한국에서 소득 불평등의 최대 주범 중 하나가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